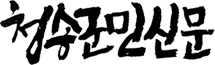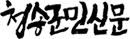우울한 寓話/박명호
평화로운 숲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숲을 다스리던 독수리가 늙고 병들자 느닷없이 목소리가 큰 거위가 뻐꾸기를 새 지도자로 추대하고 나섰다.
“자고로 ‘인지장사 기언은 선하고, 조지장사 기명은 애하다(人之將死 其言 善, 鳥之將死 其鳴 哀)’ 했거늘, 우리 새들이란 본시 슬프게 태어난 짐승인지라, 슬프게 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오. 그런데 작금의 새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노래하듯 즐겁게 지저귄다는 것은 한심하지 않을 수 없소. 슬프게 울지도 않는 새들을 어찌 새라고 할 수 있겠소? 저 뻐꾸기는 자신의 삶이 고달프거나 슬프지 않음에도 여전히 슬프게 울 수 있으니 모두가 본을 받아 마땅할 것이오.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저렇듯 슬프게 울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거위의 사촌격인 오리가 옳소 하며 한 마디 더 붙였다.
“숲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뻐꾸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집에서 남의 먹이를 얻어먹고 살다가 성장하면 미련 없이 보금자리까지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여태 자신의 집도 갖지 않은 채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새입니다.”
뻐꾸기를 본받자!
뻐꾸기 붐이 물결쳤다. 그러나 반대 세력도 만만찮았다.
뻐꾸기는 너무 촌스럽다. 그리고 우는 것도 지도자로서 품위가 없다.
숲의 주도 세력인 학들이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뻐꾸기는 원래 남쪽 숲 귀퉁이에 살았는데 자기 동네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었다. 목소리는 좋았지만 험상궂은 얼굴에다 일도 하지 않았고, 탁란(托卵)까지 일삼으니 싫어하는 새들이 많았다. 그러나 봄 한철 그가 울어대는 소리는 더러 심약한 새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바람을 잘 타는 까마귀 무리들이 기회는 이때다 며 뻐꾸기 편을 들고 나왔다.
“뻐꾸기야말로 우리 힘없는 새들의 모습이요, 또한 약한 새들의 대변자입니다.”
“옳소!”
주로 목소리가 큰 새들이 까마귀 무리에 합세했다. 조용하던 숲은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뻐꾸기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까마귀, 까치, 거위, 오리... 목소리 큰 새들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숲은 그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거위는 어느덧 울음소리도 꺼꾹꺼꾹 하면서 뻐꾸기 소리에 닮아 있었다. 오리들도 무리지어 꽥, 꽥 하던 울음을 꽤꾹, 꽤꾹 대면서 숲 속의 새들을 선동했다. 거위 오리만이 아니었다. 까마귀도 까악까악에서 까꾹까꾹으로, 참새는 째꾹, 닭은 꼬꾹, 촉새는 촉꾹으로.
숲 속에 모든 새들의 우는 소리도 닮아갔다. 본래 제 울음을 우는 새들이 이상한 새로 몰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애초에 슬픈 소리를 낼 수 없는 새들은 입을 다물었고, 슬픈 소리를 내던 새들 중에도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느 날 맹랑한 새가 나타났다. 동쪽 숲 가장자리에서 어린 새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새였다.
“우리 새들은 반드시 슬픈 소리를 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새들도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 각자 타고난 목소리에 따라 슬프게 울 수도 있고 즐겁게 노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우리는 뻐꾸기처럼 슬프게 울어야 하는가.”
그야말로 맹랑하게 지저대고 있었다.

<박명호 소설가 약력>
1955년 청송군 현서면 구산동 출생
화목초등학교 44회 졸업
1992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장편소설/가롯의 창세기 등
소설집/ 우리 집에 왜 왔니, 뻐꾸기 뿔 등
산문집/ 촌놈과 상놈, 만주 일기 등
크리스천신문 신인문예상, 부산 MBC 신인문예상
부산작가상, 부산 소설문학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