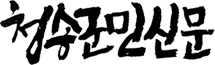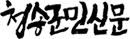어느 덧 신록이다. 이래서 시간 앞에 붙는 ~ 덧은 늘 덧없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지금 천지는 한창 연두와 녹색, 푸르른 생명력으로 리모델링 중이다. 새로이 꽃을 떨구고 잎을 내는 분주함속에는 엄혹했던 지난 겨울의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봄이고 여름이고 생명이다. 숲은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정적이지만 뿌리는 뿌리끼리, 줄기는 줄기끼리 잎은 잎끼리 햇빛을 더 잘 받기 위한 엄청난 영역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라고 약간의 꼼수와 반칙이 왜 없으랴만 서로 살기 위한 노골적인 다툼이 치열하지만 부끄러움은 없다. 위압적이거나 압도적인 힘을 갖고 홀로 군림하는 종(種) 대신에 서로 간 양해되는 선에서의 균형을 갖추어 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봄에서 한 여름으로 지나가는 이 시절에도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생활의 발목을 잡혀 늘 그 언저리이다. 하루가 다르게 일들은 몰려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벼워진 잔고는 마음을 급하게 만든다. 하여 일상은 암울한 회색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사태로 온 지구가 흉흉하고, 정치는 정치대도 경제는 경제대로 희망도 재미도 주지 못한다. 혹여 우리 젊은이들은 어떠할까. 어떤 어려움에도 분망한 활력을 주는 것이어서 젊음이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젊음은 뿌리가 뽑혀가는 나무와 같다. 어느 새 취직이 일생의 목표가 되어 졸업도 미룬 채 조그만 고시방에서 햇빛도 못 받는 식물처럼 애늙은이들이 되고 있다. 하루마다 치솟는 아파트에 양육비에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도대체 달팽이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니. 이 땅의 젊음에게 계절은 겨울만 이어진다. 저녁이면 닥치는 어둠처럼 골목마다 일렁이는 분노와 허탈이 우우거리며 몰려다닌다. 젊음이고 늙음이고 이 모든 고난의 지옥도가 한판 꿈이었으면 좋겠다.
시절이 이러하니 우리는 계절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가 됐나 보다. 철을 모르고 철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모두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사는 게 왜 점점 어려워질까. 갈수록 관의 힘은 쎄지고 아파트는 높아진다. 금융과 기술, 제도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작아진다. 그 좋다던 미래,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언제 대답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을 깍아 먹는 신자유주의는 우리시대의 압도적인 종(宗)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적할 어떠한 사상도 철학도 시스템도 없다. 자기검열과 근엄한 도덕의 얼굴을 한 우리의 숲에는 ‘함께’라는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다. 본질은 가려지고 소문만 무성한 채 각자도생의 절벽길이 이어진다. 천지의 저 푸름은 꽃을 떨구고 이뤄낸 진전이 아닌가. 숲이 꽃을 떨구듯 우리도 허위의 가면을 벗자. 서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노린다면 그것이 어찌 함께~가 되고 활력이 될 것인가. 숲을 보자. 숲은 어느 새 벗고 창신이다. 무엇을 가리고 숨기려는 이가 숲의 적이다.
최삼경 작가
자유기고가, 소설가, 시인
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 회원
강원도청 근무
저서로는 『헤이 강원도』, 『그림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음.
* 참고로 상기 글은 강원일보 5월 24일자에 게재된 '[문화단상] 숲의 푸르름을 다시 보는 이유'의 초안으로 최 작가님의 허락에 의해 본지에 다시 게재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