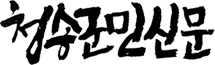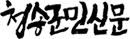칡꽃 향이 감미로운 저녁이다. 수시로 걷어내도 쉼 없이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는 칡을 보면 집중하는 삶이 보인다. 내게도 칡꽃처럼 끈질기게 피우고 싶은 꿈이 있었다. 꽃향기 핑계 삼아 달마중을 한다. 뒷동산을 힘겹게 넘어온 달이 만월이다. 지구별 사람들의 꿈 저장소엔 어릴 적 묻어두고 꺼내지 못한 내 것도 있다. 어디쯤 숨었는지 있는 힘껏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 내일은 가까운 월막에 가야겠다.
월막은 청송의 중심에 자리한 동네다. 달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산다. 평범한 사람들이 달을 보고 꿈을 꾼다면 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 꿈을 이룬 이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했다. 월막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아침 해를 데리고 청송 가운데 날마다 뜨는 달을 만나러 간다.
하느님과 통화하려면 전화기가 필요치 않듯 달의 장막 안으로 가려면 우주선이 소용없다. 바퀴 달린 자동차로도 충분하다. 내가 사는 둥지에서 월막까지는 재를 넘어가야 한다. 범이 나오는 골이어서 세 사람이 모여야 넘었다는 험한 고개는 옛말이다. 열병식을 하듯 늘어선 적송과 곡선이 주는 여유 덕분에 바이크 족들의 성지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나라 안을 통틀어 산소농도가 가장 짙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고개를 오를 때면 산소카페 청송의 공기가 깡통으로 들어가 도시로 팔려나가는 상상을 하곤 한다.
길게 펼쳐진 들을 지나 월막 초입에 들어선다. 노거수를 거느린 맑은 개천이 사람보다 먼저 객을 맞는다. 안기고 싶은 너른 품이 달에 착륙한 듯 포근하다. 옛 아낙이 새벽 빨래를 나왔다가 용을 보았다는 곳이다. 승천하는 용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용은 떨어져 바위가 되고 용이 흘린 눈물은 용전천을 이루었단다. 천 년을 공들인 미물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으나 개천은 용을 닮은 바위와 함께 이름을 얻었다. 달 장막을 덮고 살던 이들도 용의 이름을 빌려 품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모양이다.
용전천은 월막 사람들의 여름 물놀이장이었다. 용의 눈물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 몸 어딘가엔 번쩍이는 은 비늘로 덮여있을지 모른다. 이들이 자주 찾는다는 주왕산 온천엘 따라 들어가 슬쩍 확인해 봐야겠다. 잘못하여 턱 아래 숨겨둔 역린이라도 건드리면 큰일이다. 묘책도 없이 왔으니 은 비늘은 못 보더라도 매끄럽기로 소문난 온천물에 몸부터 담가 봐야겠다. 겉모양이나마 달 속에 사는 이들을 닮았으면 싶다.
용의 형상을 한 바위는 현비암이다. 어진 왕비를 낳은 바위란 뜻이다. 현비암 너머 덕천이 세종 임금의 비를 지낸 소헌왕후의 관향이기 때문이다. 용전천에 걸어둔 월막 사람들의 소망이 왕후의 가문을 탄생시키지 않았을까. 용전천 가에 그녀의 여덟 왕자가 지었다는 찬경루는 수려해서 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현비암 위에는 찬경루와 견주어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성황당이 자리해있다. 승천하던 용이 떨어진 후 마을에 흉년이 거듭되자 제를 지내던 곳이란다. 달의 장막 안에 살던 이들에게도 기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분명한 표식이다.
용의 흔적이 어린 현비암 폭포를 올려다본다. 계수나무와 방아 찧는 토끼가 없을 뿐, 달에나 있을법한 선경이다. 물줄기를 거슬러 용이 승천하는 광경을 그려본다. 용전천을 다 덮고도 남을 넓은 휘장이 필요하겠다. 그런 휘장 하나쯤 마련해 놓고 승천을 준비하는 용이나 기다려볼까. 달에게 비손하는 것보다 용의 등에 올라타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 게으른 상상에 빠진 내게 월막 사람 하나가 넌지시 다가와 귀띔한다. 일몰 녘에 바라보는 현비암 폭포야말로 비경 중에 비경이란다. 달로 휘장을 덮은 이곳에도 해가 진다는 사실이 동화처럼 들린다.
월막 사람들이 산책을 즐긴다. 달의 장막 주변에서는 사과 익어가는 소리 들리는데 바쁠 일 없다는 듯 느릿느릿 걷는 폼이 편안하다. 달빛에 그을렸는지 살결마저 매력적이다. 맑은 물에 비친 그들 몸짓에선 달콤한 사과 향이 날 것 같다. 천변에 흩뿌려진 그들만의 여유가 눈부시다. 몸 안에 신전을 모신 사람들처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함이 묻어난다. 지금껏 가속이 붙어 버거운 현실을 사는 칡 닮은 이들만 본 탓일까. 꿈꾸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인가 보다. 나는 따로 달 구경을 가야 할 이율 알지 못한다.
달의 장막을 보았으니 이어져 있는 달기 계곡을 보러 간다. 달의 장막 한쪽을 솥뚜껑처럼 싸고 있는 부곡 사람들은 달의 안도 바깥도 아닌 중간에서 약수에 기대 산다. 몸에 이로운 약수의 맛이 얼마나 향기로우면 달기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계곡을 찾는 여행객들은 달기약수에 푹 고운 백숙으로 지친 심신을 다독인다. 톡 쏘는 약수로 지은 밥은 파르라니 달빛을 닮았단다. 부곡이 달의 장막 곁에 엎드린 까닭을 알겠다.
약수탕으로 이름난 달기 마을에 왔으니 백숙을 안 먹고 지나칠 순 없다. 중탕에 들어 달기 백숙이 삶아지는 동안 황기 엿을 입에 물고 약수를 들이켠다. 특유의 철분 맛을 달달한 약 엿이 감해준다. 달의 장막과 솥뚜껑 계곡처럼 딱 맞는 궁합이다. 위장병에 효험 본 이가 많아서일까 평일인데도 식당 여기저기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다. 압력솥 뚜껑에 김빠지는 소리 요란하더니 잘 익은 백숙에 갖가지 장아찌가 푸짐하게 차려졌다. 달의 장막 속을 다녀온 장거리 여행자답게 식욕이 물밀 듯 밀려온다.
달처럼 부푼 배를 안고 달의 바깥으로 간다. 부곡과 맞닿은 월외엔 사과 농사를 짓고 잎담배를 따는 사람들이 산다. 백악기 시간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한 월외계곡은 그들이 소풍 삼아 드나들던 길이었다. 비췻빛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아껴두고 보고 싶은 그들만의 낙원이라 했다.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 넣어도 바닥이 닿지 않았다는 월외 폭포는 용이 하늘로 올랐다 하여 용소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달의 장막 안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달의 바깥에서 이루었으니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더 이상 꿈꿀 일이 없을 것 같다. 오늘은 달의 바깥 계곡 어디쯤에서 청아한 물소리 들으며 달 뜨는 구경이나 해야겠다. 어릴 적 꿈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박월수(1966년생) 작가는 2009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수필 '달'로 등단하였으며 현재 청송 문인협회 부회장, 청송 ‘시를 읽자’ 회원으로 청송군 현동면 인지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